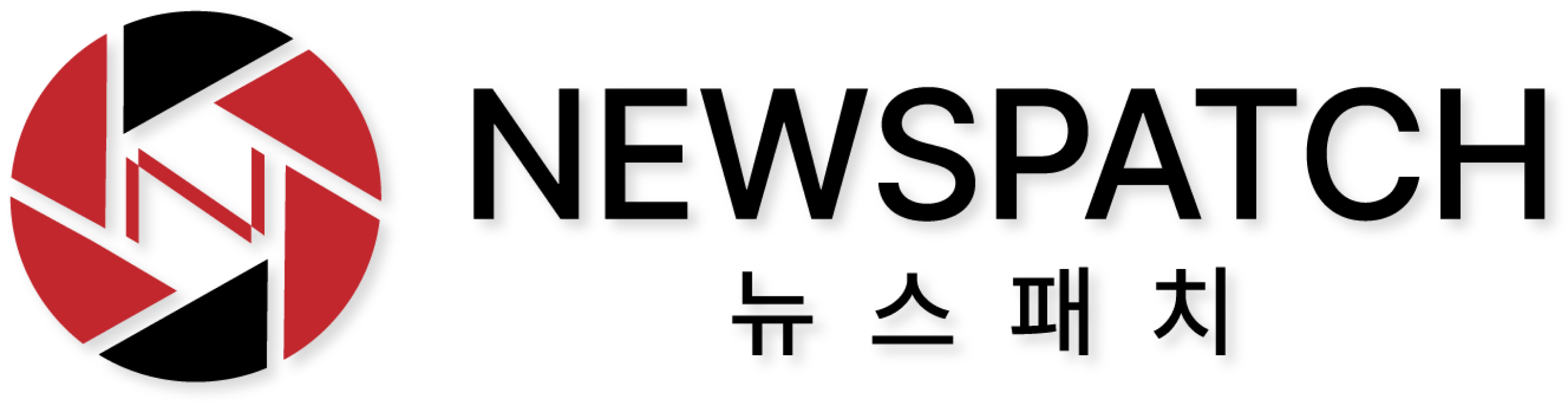이태원 참사 후 소방관 사망... 심리적 고통에도 미흡한 지원 드러나
누군가를 구하는 일이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쳤던 소방관 A씨가 세상을 떠났다. 2년여 동안 그는 9차례의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트라우마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
그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유독 아프게 다가온다. 구하지 못한 생명들에 대한 미안함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조차 구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미안함이었을까.
소방관들의 심리적 고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천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중 40%가 우울증, PTSD, 수면장애 등을 앓고 있다.
2명 중 1명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는 이들이 처한 현실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들은 매일 죽음과 고통의 현장으로 달려가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상담 횟수나 치료 프로그램의 부족이 아니다. A씨는 충분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는 현재의 심리 지원 시스템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라우마는 개인의 의지나 전문가의 도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다.
특히 반복적으로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소방관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소방관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의 뿌리에는 '구조자의 딜레마'가 있다. 그들은 모든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구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 동료의 안전에 대한 걱정, 가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때다. 사후 치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과 일상적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
소방관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개인의 나약함이 아닌 직업적 특성으로 인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기적인 심리 검진을 의무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현장 투입을 조절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소방관들의 심리적 안전망을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 그들도 상처받을 수 있는 평범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한다.
완벽한 영웅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A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소방관들의 심리적 건강을 지키는 일에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 구조자를 구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